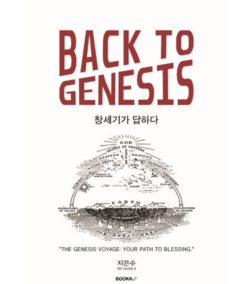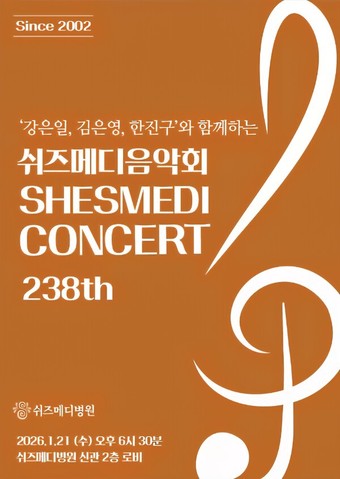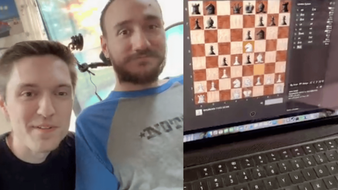속초-0.3℃
속초-0.3℃ 북춘천-3.4℃
북춘천-3.4℃ 철원-3.6℃
철원-3.6℃ 동두천-2.7℃
동두천-2.7℃ 파주-3.9℃
파주-3.9℃ 대관령-7.8℃
대관령-7.8℃ 춘천-1.6℃
춘천-1.6℃ 백령도-3.0℃
백령도-3.0℃ 북강릉-0.9℃
북강릉-0.9℃ 강릉-0.1℃
강릉-0.1℃ 동해0.2℃
동해0.2℃ 서울-2.8℃
서울-2.8℃ 인천-2.0℃
인천-2.0℃ 원주-2.7℃
원주-2.7℃ 울릉도0.3℃
울릉도0.3℃ 수원-4.1℃
수원-4.1℃ 영월-2.9℃
영월-2.9℃ 충주-3.3℃
충주-3.3℃ 서산-4.9℃
서산-4.9℃ 울진0.0℃
울진0.0℃ 청주-2.3℃
청주-2.3℃ 대전-2.1℃
대전-2.1℃ 추풍령-1.8℃
추풍령-1.8℃ 안동-2.2℃
안동-2.2℃ 상주-0.9℃
상주-0.9℃ 포항1.4℃
포항1.4℃ 군산-2.9℃
군산-2.9℃ 대구0.6℃
대구0.6℃ 전주-2.0℃
전주-2.0℃ 울산1.7℃
울산1.7℃ 창원2.8℃
창원2.8℃ 광주0.0℃
광주0.0℃ 부산3.5℃
부산3.5℃ 통영2.6℃
통영2.6℃ 목포-1.0℃
목포-1.0℃ 여수1.4℃
여수1.4℃ 흑산도3.0℃
흑산도3.0℃ 완도0.6℃
완도0.6℃ 고창-2.1℃
고창-2.1℃ 순천-1.3℃
순천-1.3℃ 홍성-3.0℃
홍성-3.0℃ 서청주-3.4℃
서청주-3.4℃ 제주4.3℃
제주4.3℃ 고산3.9℃
고산3.9℃ 성산3.0℃
성산3.0℃ 서귀포8.2℃
서귀포8.2℃ 진주1.2℃
진주1.2℃ 강화-1.9℃
강화-1.9℃ 양평-2.0℃
양평-2.0℃ 이천-3.7℃
이천-3.7℃ 인제-2.6℃
인제-2.6℃ 홍천-4.0℃
홍천-4.0℃ 태백-6.6℃
태백-6.6℃ 정선군-3.6℃
정선군-3.6℃ 제천-3.4℃
제천-3.4℃ 보은-2.8℃
보은-2.8℃ 천안-3.0℃
천안-3.0℃ 보령-3.6℃
보령-3.6℃ 부여-2.4℃
부여-2.4℃ 금산-1.4℃
금산-1.4℃ 세종-2.2℃
세종-2.2℃ 부안-3.1℃
부안-3.1℃ 임실-2.8℃
임실-2.8℃ 정읍-2.8℃
정읍-2.8℃ 남원-1.7℃
남원-1.7℃ 장수-5.7℃
장수-5.7℃ 고창군-2.6℃
고창군-2.6℃ 영광군-2.5℃
영광군-2.5℃ 김해시1.2℃
김해시1.2℃ 순창군-2.0℃
순창군-2.0℃ 북창원3.2℃
북창원3.2℃ 양산시1.7℃
양산시1.7℃ 보성군0.7℃
보성군0.7℃ 강진군0.8℃
강진군0.8℃ 장흥0.0℃
장흥0.0℃ 해남-0.3℃
해남-0.3℃ 고흥0.0℃
고흥0.0℃ 의령군-0.3℃
의령군-0.3℃ 함양군-0.4℃
함양군-0.4℃ 광양시0.4℃
광양시0.4℃ 진도군0.2℃
진도군0.2℃ 봉화-5.8℃
봉화-5.8℃ 영주-2.3℃
영주-2.3℃ 문경-2.2℃
문경-2.2℃ 청송군-1.9℃
청송군-1.9℃ 영덕0.1℃
영덕0.1℃ 의성-3.0℃
의성-3.0℃ 구미-1.5℃
구미-1.5℃ 영천0.2℃
영천0.2℃ 경주시0.8℃
경주시0.8℃ 거창-1.2℃
거창-1.2℃ 합천1.7℃
합천1.7℃ 밀양-0.8℃
밀양-0.8℃ 산청-0.2℃
산청-0.2℃ 거제2.1℃
거제2.1℃ 남해1.9℃
남해1.9℃ 북부산-1.1℃
북부산-1.1℃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교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예배당 문이 닫히자 대부분의 교회는 부랴부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한 예배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대안이자, 놀라운 확장력을 지닌 새 도구처럼 보였다. 거리와 국경을 넘어 수천 명이 동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부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벱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는 최근 보고서에서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초기의 동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에 따르면 팬데믹 정점기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더 이상 꾸준히 시청하지 않는다.
바나(Barna) 조사 또한 대부분의 신자가 “현장 예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결국 온라인 예배의 급증은 혁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사람들은 화면을 통한 예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함께 모이기를 갈망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는 설교와 찬양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예배는 정보를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경험이다. 함께 부르는 찬송, 기도의 울림, 회중의 숨결은 화면을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회로 가는 행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다. 현장 예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라”는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온라인 예배의 또 다른 문제는 산만함이다. 예배 중 울리는 전화벨, 세탁기 알람, SNS 알림은 집중을 끊는다. 클릭 한 번이면 뉴스나 다른 영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조회 수는 유지하지만, 시청 시간과 몰입도는 크게 떨어졌다. 편리함 역시 양날의 검이다. 온라인 예배는 이동이 어렵거나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건강한 신자들에게 ‘쉽고 빠른 예배’의 유혹을 제공한다. 그 결과 헌신과 참여는 줄어들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 콘텐츠 소비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했다. 편리함이 기준이 되면 신앙의 깊이는 얕아진다.
그렇다고 온라인 사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환자나 노약자, 여행 중인 신자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소중한 창구다. 새로 이사한 교인이 교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다. 문제는 그것이 대체재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도구는 주일 예배를 대신하기보다, 주중 묵상이나 소그룹, 제자훈련 등 교회 사역의 깊이를 넓히는 보조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결국 중심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 곧 현장 예배여야 한다.
온라인 예배의 피로감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신앙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시 122:1)고 고백했다. 그 기쁨은 화면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 직접 함께 모이고, 목소리를 합치며, 서로의 존재를 느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스크린은 훌륭한 종(servant)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집(home)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